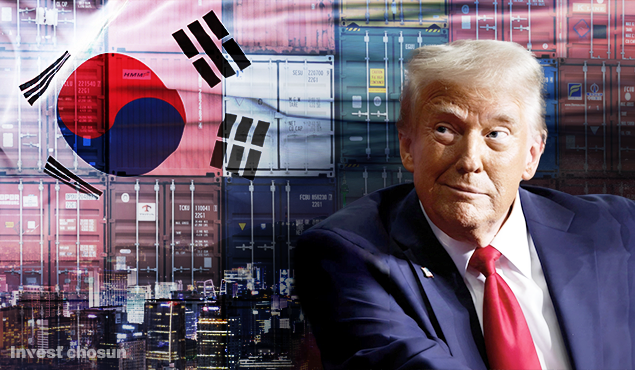-
미국이 시작한 관세전쟁의 파급효과가 예상보다 더 복잡한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중국 정부가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들어선 이상 개별 협상으로 충격을 상쇄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관세전쟁이 트럼프 2기에서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함께 거론된다. 미국 현지 기업들도 전체 충격파를 가늠하지 못하고 있어 당분간 국내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이 이어질 수 있다는 평이다.
7일(현지시간) 미국 주식시장은 개장 직후 '90일간 관세 정책이 유예될 것'이란 뜬소문으로 출렁였다. 백악관이 가짜 뉴스라며 바로 반박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재차 중국을 향한 강공 메시지를 내놨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8일까지 중국이 34% 보복관세를 철회하지 않으면 중국에 추가로 5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와의 협상이 계속된다는 소식에 증시는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그러나 8일 중국 상무부는 담화문을 내고 "미국의 관세 경고에 끝까지 맞설 것"이라고 반격했다. 양측 모두 시장 충격과 반발을 감내하고서라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결국 미국은 중국의 보복관세에 대응해 9일(현지시간) 중국에 대한 관세를 1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대신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 90일간 상호관세 유예 방침을 밝혔다. 뉴욕증시 3대 지수는 기록적인 수준으로 급반등했다. 시장에서는 미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혼란이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것을 우려해 트럼프가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럼에도 미국채 금리는 이틀 연속으로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미중 간 강대강 충돌이 본격화하며 관세전쟁의 성격을 일방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업계에서도 파장을 두고 해석이 엇갈리는 가운데 어느 쪽에 무게를 둘지 판단이 어려운 분위기다.
일단 주먹구구식 상호관세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몽니로 치부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늘고 있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역시 트럼프 1기 시절 본격화한 자국 우선주의를 보조금 정책으로 제도화했다. 트럼프 2기가 고율 상호관세로 재차 바통을 이어받은 것으로 본다면 정권을 가리지 않고 미국 중심의 통상정책이 상수로 자리 잡는 과정이란 분석도 가능한 셈이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트럼프 1기 때와는 달리 관세전쟁을 촉발하는 동시에 국제유가는 떨어뜨리는 식으로 금리 인하를 위한 명분까지 마련해둔 상황으로 보인다"라며 "1기 때의 학습효과를 기반으로 자국 충격을 상쇄할 수단까지 갖춘 채 통제 가능한 충격을 주는 셈이다. 연준(Fed)의 반응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지금 상황을 단순히 트럼프 대통령만의 고집으로 보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아무리 미국이라도 관세전쟁의 파급효과를 통제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반박도 많다. 상호관세로 유리한 협상을 이끌어내고 충격은 통화정책으로 상쇄한다는 시나리오가 단순한 가정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특히 1기 당시와 달리 최근 중국의 반도체·전기차·로보틱스 등 첨단 제조업 역량이 괄목할 성장을 보이고 있어 관세전쟁의 양상을 더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중국과 미국 공급망이 따로 놀기 시작하면 협상으로 최종 관세율을 낮추더라도 얻게 되는 실익이 별로 없을 수 있다"라며 "미국 기업들도 리스크 프라이싱이 안 되는 상황인데 순서 상 뒷단에 있는 국내 기업들이 뭔가를 판단하기도 쉽지 않다"라고 말했다.
국내 대기업으로선 미국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따르기도 따르지 않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풀이된다. 중국이 비(非)미국을 중심으로 블록화를 꾀하고 있어 고율 관세를 피하자고 섣불리 미국행을 택하는 데 따른 대가 역시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4일 중국 상무부는 고율 관세에 맞서 전략물자인 중량 희토류 7종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에서 시작된 문제가 핵심 원자재 공급망 통제로 번지는 양상이다. 중국의 희토류 매장량과 채굴, 정제·가공 역량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내 대기업들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2차전지에 활용되는 희토류의 중국 수입 의존도는 50% 이상으로 추산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 팹(Fab)부터 LG에너지솔루션, SK온의 배터리셀 공장 등 중국 현지 생산기지의 활용도 역시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이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난 수년 동안 중국 내 생산설비의 장비 반입이나 공정 전환에서 양국의 눈치를 살펴온 상황이기도 하다.
일각에서는 조기 대선 국면을 계기로 추가경정예산, 확장재정 등 경기 부양 조치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내비치고 있다. 정치권에서 충격 일부를 상쇄할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관세전쟁의 전체 충격파에 비하면 규모 측면에서 사소한 변수에 그칠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中 강경 대응으로 상호관세 파급효과 더 복잡해지는 양상
트럼프 2기에 그치지 않고 관세전쟁 상수화 할 가능성도
리스크 측정 불가…기업 전반 섣불리 대응 어려운 분위기
협상으로 관세율 낮춰도 美中 공급망 나뉘면 실익 불투명
트럼프 2기에 그치지 않고 관세전쟁 상수화 할 가능성도
리스크 측정 불가…기업 전반 섣불리 대응 어려운 분위기
협상으로 관세율 낮춰도 美中 공급망 나뉘면 실익 불투명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25년 04월 09일 07:00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