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비기업 퇴출 대신 정부 지원책 중심
어려운 일은 정부 대신 PEF가 알아서 해달라 수준
-
'비올 때 우산 뺏는 은행'이란 표현은 2004년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중소기업 여신 회수에 급급한 은행을 비판할 때 자주 썼다. 고(故) 강권석 행장의 기업은행장 취임 당시에도 쓰였다. 이후에도 흔하게 통용됐다.
18일 문재인 정부의 기업 구조조정 방식을 알리는 자리에도 쓰였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PEF는 기업 사냥꾼 이미지가 강하지만....최근 부실기업에 신규자금을 공급하는 등 '비올 때 우산을 가져다 주는' 성공사례가 점차 생겨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개된 방안에서는 우려한 대로 'PEF 만능주의'가 다시 부활했다.
◆잘해야 70개 기업에 펀드 투자 불과
이날 정부가 발표한 '구조조정'의 정의(Definition)나 방향성 등은 차치하고. 일단 실효성만 따져보자.
산은ㆍ수은ㆍ기은과 캠코ㆍ한국성장금융, 그리고 시중은행이 참여해 5000억원을 출자한다. 민간자금을 덧붙여 1조원 펀드를 만든다. 이를 굴릴 운용사를 뽑아서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투자한다. 그러면 생산유발 효과 2조원ㆍ취업 유발효과 1만1000명이 기대된다는 논리다.
이 자금을 기업 1곳당 500억원씩 투자한다면 총 20곳이 투자를 받는다. 금액을 줄여 회사 1곳당 200억원을 투자하면 50개가 나온다.
레버리지(Leverage)를 일으키면 투자회사가 좀 늘어날 수 있다. 대략 70곳 정도? 그러나 정부 주도 자금이 들어갈 정도의 회사라면 레버리지를 일으킬 상황은 못된다. 대상 기업수를 더 늘리고자 건당 집행금액을 줄인다면 '투자'라는 이름보다 '설비대금 저리지원'이 어울린다.
현재 국내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체 숫자가 555만4266개다. (중소기업 조사통계시스템) 이 가운데 제조업체 숫자만 48만6240개다.
이조차 3년 전 옛 중소기업청이 발표한 통계다.
◆좀비기업 퇴출은 어디가고...지원책 중심
지난 수년간 국내에서 요구된 구조조정의 요체는 '칼'이었다.
공정 경쟁을 무시하고, 시장과 소비자의 외면을 받은 좀비기업의 자연스러운 퇴출이다. 이를 가로막은 원인 중 하나가 정책자금의 그릇된 특혜성 지원이었다. 해결 법은 간단했다. 눈 먼 돈이 흘러가지 않도록 하고, 국책은행이든 시중은행이든 의사결정이 외부요인에 휘둘리지 않으면 된다.
산업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정말로 '자금 수혈'이 필요한 기업을 살려내야 한다는 원칙과도 어긋나지 않는다. 대우조선해양에 때려 넣은 수조원이 다른 회사들로 투입됐다면?
하지만 이번 발표에는 '구조조정'보다 '구조혁신'이란 표현이 자주 쓰였다. '일자리 창출' , '금융시장의 적기지원', '공적지원' 의 단어도 자주 나왔다.
"기술력은 우수하나 시장에서 소외된 회생기업에 대한 공적지원을 통해 사회적ㆍ경제적 손실방지가 필요하다"가 요체로 보인다. 심지어 "한도성 여신이 은행에서 소극적으로 지원될 수 있으니 정부가 보증안 등을 마련해 잘 지원되도록 하겠다"라는 내용까지 포함됐다. "어떤 기업이 퇴출되어야 한다"라는 내역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어려운 일은 누가? 정부를 대신해서 PEF가
'구조조정'이 되었든 '구조혁신'이 되었든 우선 자금을 투자해도 좋을만한 기업을 찾아내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들의 기술력ㆍ경쟁력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재무제표의 허실을 따져야 한다. 해당 업종과 기업의 경쟁력을 SWOT 분석하고, 이에 필요한 산업정책과 규제해소안 등을 동시 고려해야 한다. 그 다음에야 미래전략 수립도 가능하다.
돈만 준다고 경쟁력이 급증하는 기업은 없다. 저 과정들이 사실은 구조조정의 진짜 '업무'다.
이 험난하고 고된 일은 누가? 이번 정책에 따르면 민간이, 정확히는 'PEF 운용사'가 돈을 받은 후에 알아서 한다. "정부가 하기보다는 실력있는 민간이 나서주면 자연스럽게 잘 될 것이다"라는 논리다. 어찌보면 정부의 역량부족을 자인하는 모양새다.
이러다보니 최종구 원장도 자금 배포를 맡을 한국성장금융을 콕 찍어 "능력 있고 기업에 애정을 가진 PEF를 발굴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 달라, 관련교육도 충실히 하고 성공사례도 지속 창출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물론 PEF 선정과정에서 '공정한 절차를 거치라' 는 주문도 빠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PEF운용사는 왜 이 험난한 작업에 참여해야 할까? 무슨 이득이 있어서?
근래 이런저런 미사여구로 자주 포장되지만 PEF의 본질은 고수익을 추구하는 시장의 하이에나ㆍ벌처와 같은 투자자본이다. '돈이 되지 않는 곳'에는 가지 않고, 거꾸로 '돈이 되는 곳'이라면 오지 말라고 해도 알아서 찾아간다. 정부의 정책성 목적으로 이들을 움직일 수는 없다.
물론 출자금을 기대하는 전문가들도 있을 것이다. 이들은 "이제는 자본시장이 글로벌 트렌드를 모니터링하고, 굴뚝산업의 4차산업 탈바꿈으로 혁신을 선도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라는 뻔뻔하면서도, 당당한 정부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어야 한다.
◆해묵은 펀드 만능주의는 세 정권 연속
사회적 합의를 마련하고, 관련 예산을 통과시키고, 입법을 수반한 정책으로 해야 할 일을 각종 '펀드 설립'으로 손쉽게 대체하는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MB정부의 '녹색펀드', '탄소펀드', '자원개발펀드' 가 그랬고, 박근혜 정부의 '청년희망펀드', '통일펀드', '상생펀드' 가 그랬다.
PEF를 통한 구조조정 활성화와 이에 산은ㆍ수은ㆍ유암코 동반 출자는 임종룡 위원장때도 마련됐다. 실패하더라도 정부는 큰 부담이 없다.
정부만 그런 것도 아니다.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도 수장의 면을 세우거나 연임 논리가 필요할 때, 혹은 정부 입김을 신경 쓸때 "PEF로 무언가를 하겠다"라는 자료로 생색을 냈다. 일례로 IBK기업은행의 경우. 올 한해 4번에 걸쳐 '승계 지원 투자를 하겠다'(4월), '33억원을 투자했다'(8월), '100억원을 투자했다'(11월), '500억원 PEF를 조성했다' (12월)라며 김도진 행장 명의의 '미사여구'로 가득한 보도자료를 연일 배포하고 있다. 이전 정권에서 수장이 되다보니 좌불안석인 국책은행장의 전형적인 '새 정부 코드 맞추기' 일환으로 평가받고 있다.
모두 PEF 만능주의의 폐해다.
'비올 때 우산 뺏는 은행'이란 말은 원래 '톰소여의 모험' 으로 유명한 미국 소설가 마크 트웨인(Mark Twain)이 쓴 표현으로 알려진다. 원문은 "은행가란 놈들은 햇빛 쨍쨍할때 우산 빌려줬다가 비가 내리는 딱 그 순간에 도로 뺏아가는 작자들이야" (“A banker is a fellow who lends you his umbrella when the sun is shining, but wants it back the minute it begins to rain.”)
생전에 마크 트웨인은 금광투자ㆍ주식투자 등으로 자주 망해서 수시로 은행에서 빚 독촉을 당했는데, 그 무렵 나온 일갈로 보인다.
그런데 따져보면 은행만큼 '리스크'를 감내하지 않는 금융기관도 없다. 이자만 꼬박꼬박 나오고, 원금 회수 위험만 없으면 별로 채무자를 귀찮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PEF 등의 투자자가 진정한 잔소리꾼이다.
하지만 지금 한국에서는 채권은행이 그간 해온 짓이 야비하다며 KKR의 등장 이후 자본주의의 최첨단을 달려온 PEF에게 정부가 나서 "정책 목적을 달성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9세기를 살았던 미국 소설가의 불만을 정책자료에 녹여가면서.
-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17년 12월 18일 17:02 게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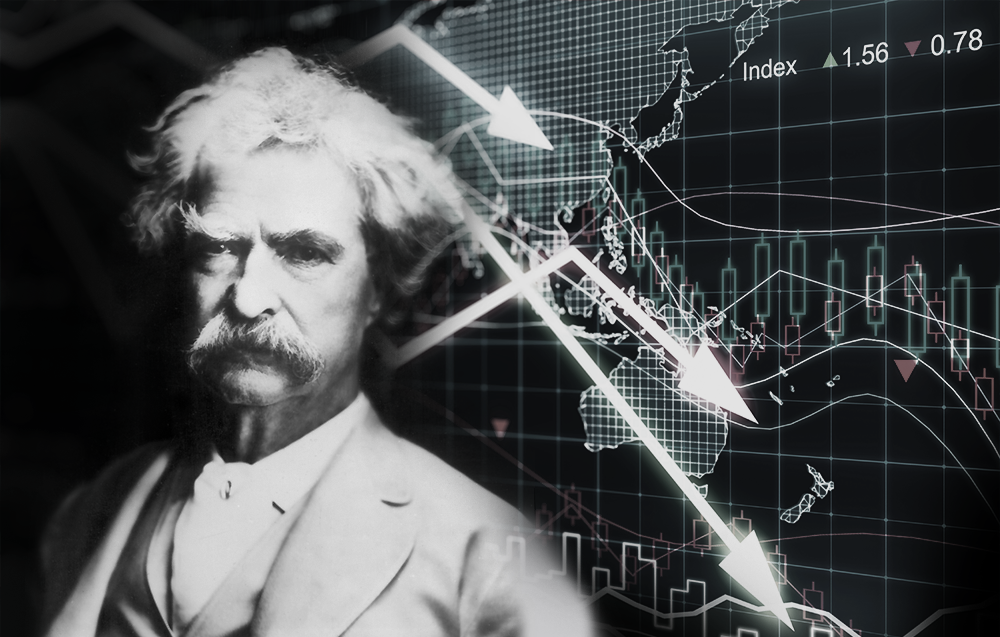 이미지 크게보기
이미지 크게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