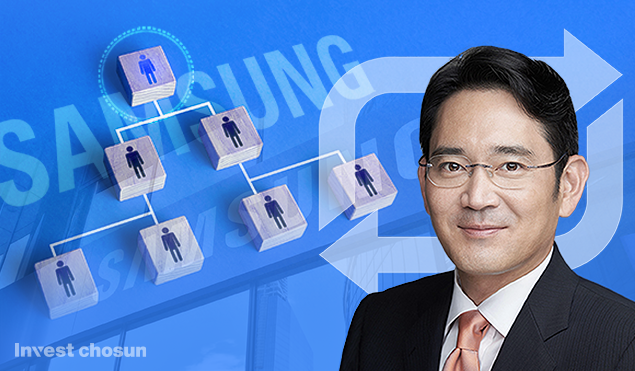-
삼성전자는 말 그대로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 1분기에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그 사실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고, 52주 신저가 경신이 그 자리를 채웠다. 이젠 삼성전자 하면 더 이상 '1등'이 떠올려지지 않는다. 반도체 시장에선 앞뒤로 치이고 있고, GOS(Game Optimizing Service, 게임 최적화 서비스) 논란은 수그러들 기미가 안보이는데 이번엔 통화불량 논란까지 더해졌다. '6만전자'에 갇힌 건 덤이다.
삼성전자의 '패스트 팔로워(Fast Follower)' 전략은 그 수명이 다 됐다. 최근 몇 년 새 IT 시장은 대변혁의 길에 접어들었는데 삼성전자는 재무 상황만 빼면 사업적으로나 경영진 수준이나 회사 분위기나 뭐 하나 '일류'라고 할 만한 게 없다. 몇 년 전부터 공언했던 '퍼스트 무버(First Mover)'는 공염불이 된지 오래다.
퍼스트 무버 자체가 무리한 도전이었는지도 모른다. 전 세계 IT기업 중에서 삼성전자만큼 전장을 펼쳐놓은 기업은 없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같은 부품에서부터 스마트폰, 생활가전 등 세트까지 수직계열화가 구축돼 있다. '내 편'보다는 '적'이 더 많아졌다. 여타 IT기업들처럼 CEO의 카리스마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어려운 구조다. 시스템경영이라는 단어가 괜히 나온 게 아니다.
이재용 부회장 부재 시절부터 불안감은 감지됐다. 경영진 너나할것없이 시스템경영 아래에서 보신주의가 팽배해지고 있다는 내부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품질'제일주의보단 '안전'제일주의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김기남 종합기술원 회장, 김현석·고동진 고문 등이 이재용 부회장의 빈자리를 메꿨다고는 하지만 어찌보면 그 때부터 삼성전자에서 '혁신'이라는 단어를 찾아보기 더 어려워졌다. 그 누구도 책임 지거나 묻지 않는다. 어느 순간 삼성전자 경영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혁신을 위한 실패보다 실적이 깨지지 않길 바라게 됐다. 그러니 최대 매출, 최대 이익을 기록해도 시장은 움직이지 않았다.
이재용 부회장이 돌아온 후에도 크게 달라지진 않았다. 갤럭시 GOS 논란에 한종희 부회장은 고개를 숙였지만 변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박한 평가가 나온다. TV개발 전문가 출신인 한 부회장이 세트 부문의 수장이 된 것을 두고 IM까지 포함된 거대 조직을 맡기에 적합한 인물이었냐는 논란은 지속중이다. 노태문 MX 사업부장의 '자체 AP 개발' 발언을 보면 DS부문과 사전 협의가 이뤄진 사안인지, 내부적으로 뭔가 손발이 맞지 않는 느낌이다.
과거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삼성전자의 기업분할을 요구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복잡한 지배구조와 반도체, 스마트폰, 가전을 망라하는 비대한 사업 구조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저평가됐다는 게 엘리엇의 주장이다.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회사를 나누면 더 강하고 안정적인 기업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고 조언했는데 현실성이 있든 없든 지금의 삼성전자에 가장 필요한 얘기인 것은 분명하다.
삼성전자 이사회 조직이 경영진의 판단 미스를 바로잡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도 문제다. 김한조 전 이사장, 김종훈 회장, 한화진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석좌교수, 김준성 전 싱가포르투자청(GIC) 매니징 디렉터, 김선욱 포스코 청암재단 이사장, 박병국 서울대 공대 교수. 각 업계의 전문가라고는 하지만, 100% '로컬화' 이사회가 글로벌 경쟁에서 뒤쳐지고 있는 삼성전자에 걸맞는다고 보긴 어렵다. 어떻게 하면 삼성전자가 국내에서 문제를 덜 일으킬까에 방점이 찍힌 듯 하다. 그 사이 글로벌 기업들은 '진짜' 전문가들을 사외이사에 앉히는데 공을 들이고 있다.
혹자들은 이 위기를 이재용 삼성전하 부회장의 '개인기'로 타파하기를 기대하기도 한다. 애플의 팀 쿡(Tim Cook), TSMC의 마크 리우(Mark Liu), 엔비디아의 젠슨 황(Jensen Huang), AMD의 리사 수(Lisa Su) 등 굴지의 IT기업들은 CEO가 전면에 나서 이끌어 나가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은 그들과 달리 업계 전문가가 아니다. 이 부회장이 진두지휘한 딜은 하만 인수 외에 눈에 띄는 게 없고, 그마저도 성과를 두고선 갑론을박 진행형이다. 그런 와중에도 삼성전자 경영진들은 M&A를 공언하고 있는데 마땅한 매물은 안보인다. 그저 누가 듣기에 좋은 말들만 하는 것 아닌가 싶다. 아버지였던 고(故) 이건희 회장의 삼성전자가 '품질경영'이라고 요약한다면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전자는 '원가절감'이라고 낙인찍힐지 모른다.
삼성전자가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빠졌다고 해도 모자라지 않는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나와 '쇼'를 하는 일론 머스크의 모습을 기대하는 것도 아니다. 시장에선 특별한 대안을 내놓지 않더라도 리더가 방향성을 보여주길 고대하고 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시장은 삼성전자의 정체성을 '그냥 이것저것 다 만들어 파는 덩치가 큰 전자기업'으로 규정지을 테다. 회사의 미래가치가 떨어질수록 내부 구성원들의 불만은 증폭될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외부 인재수혈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내부 인력 이탈은 삼성전자의 가장 강력한 아킬레스건이자, 트리거다.
입력 2022.04.14 07:00
Invest Column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22년 04월 12일 07:00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