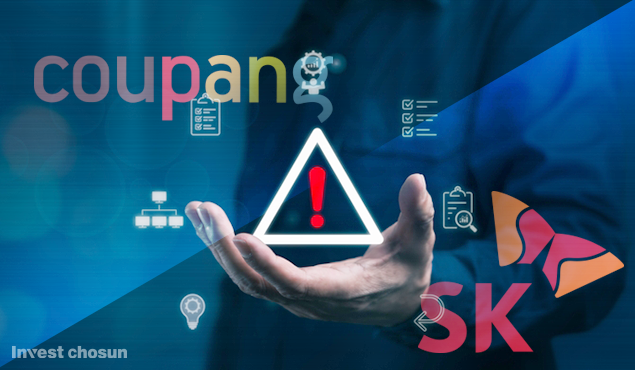-
2021년 쿠팡의 핵심 물류센터 중 하나인 이천 덕평리 물류센터에 화재가 발생하자 자본시장 관계자들의 반응은 대부분 비슷했다.
"가만히 있을 골드만삭스가 아닐텐데…"
2017년 골드만삭스는 쿠팡의 물류센터 두 곳(이천·인천)을 담보로 쿠팡에 3000억원을 빌려줬다. 중순위와 후순위로 트랜치를 구분했고 각각의 이자율은 약 6~10% 수준이었다. 담보 가치를 5000억원으로 계산해 담보대출비율(LTV)은 60%를 책정했다. 선순위 채권 일부는 유동화했다.
만기가 1년 가까이 남은 상황에서 화재로 인해 핵심 담보가 눈 앞에서 사라진 순간. 채권자 입장에선 기한이익상실(EOD)을 선언하고 담보권을 행사하는게 당연한 수순이었다.
사실 애초부터 연 8% 넘는 이자를 따박따박 챙겨가든지 최악(?)의 경우 담보자산을 인수하든지 어떠한 경우라도 골드만삭스 입장에선 손해볼 것 없는 장사였다. 어찌보면 화재가 났을 당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국내 물류센터의 가격은 고공행진하던 시점이었고 특히 경기도 지역 물류센터 설립 자체가 까다로워지면서 이천 물류센터의 가치도 치솟고 있었기 때문에 골드만삭스는 내심 담보권 행사를 원했을지 모른다.
결론적부터 말하자면 골드만삭스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천 물류센터가 전소하자 쿠팡은 곧바로 골드만삭스 실무진을 찾았다. 쿠팡은 3000억원의 현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10%의 만기 이자까지 확약했다. 혹시모를 EOD 선언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됐다.
사실 그당시 쿠팡은 미국 증시에 상장한 직후였던터라 '3000억원+이자'를 지급할 여력은 충분했다. 쿠팡은 3000억원의 자금이 일시에 묶이는 기회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당장' 갚을 수 있는 대출금을 왜 만기때까지 유지하려고 했을까?
당시 쿠팡은 글로벌 신용평가사들로부터 신용등급 획득 작업을 진행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를 위해선 금융기관 또는 투자자로부터 빌린 자금을 당초 '계획대로' 꼬박꼬박 상환하는 이력이 필요했다. 현금이 넘쳐 당장 갚을 수 있다하더라도, 투자자들과의 맺은 최초의 약속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지키겠단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예측 가능한 기업'이란 이미지를 구축하려 했을지도 모른다. 물론 지금의 쿠팡은 더이상 예전의 그 절실했던 회사가 아니다.
어찌됐건 현금 담보를 제공받은 골드만삭스는 대출에 대한 리스크가 제로(0)에 수렴했다. 여기에 이자까지 더 얹어 준다고 하니 EOD를 선언할 명분과 이유가 없어졌다. 쿠팡은 1년 후 만기 상환했고 골드만삭스는 연 10%에 육박하는 투자에 성공했다. 투자자들에 따라 연 10%의 수익률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지만, 리스크가 사실상 없는 투자로 매년 수 백억원의 이자를 챙길 수 있다면 이야기가 다르다.
그룹의 '평판'을 대하는 미국 회사와 한국 기업의 문화 차이였을까. 아니면 바닥에서 시작한 플랫폼 기업과 재벌 그룹 태도의 차이였을까.
SK그룹 평판 리스크가 확산한 단초는 지난해 SK스퀘어의 11번가 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 포기 사태이다. 콜옵션은 말 그대로 옵션이고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아니다. 이제까지 대기업이 콜옵션을 포기해 재무적투자자(FI)와 등을 진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SK의 콜옵션 포기가 초유의 사태로 비유됐을 뿐이다.
대기업과 FI 사이 거래가 늘 그렇듯 투자자는 오너에 대한 신의, 그리고 대기업에는 뒤통수를 맞지 않을 것이란 '믿음'에서 출발한다. 수 백억, 수 천억원의 자금이 오고가는 자금 거래에 '믿음'이란 로맨틱한 단어가 등장하는게 다소 모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많은 거래가 아직도 여기서 출발하는게 사실이다. 적어도 IPO가 불발돼 회수의 길이 막히게 된다하더라도 그룹이 투자금을 돌려주거나, 적어도 FI가 투자한 회사를 성실(?)하게 사업을 이끌어 갈 것이란 판단이 기저에 깔려있다.
SK는 11번가의 콜옵션 행사를 포기하면서 '배임'의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사실 '배임'이 이번 사태의 본질로 보긴 어렵다.
과거 11번가는 2016년부터 외부 투자 유치를 추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었다. 쿠팡을 비롯한 유통 공룡들의 경쟁이 치열해 지는 상황에서 생존을 위한 자금이 절실했다. 그 때 11번가에 투자를 결심한 곳이 국민연금이다. 숨통이 트인 11번가는 5년의 생명 연장에 성공했다. 물론 경영의 실패로 미래를 장담하긴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배임'을 앞세워 투자금을 못 돌려줄 수준의 거래는 아니었단 의미다.
투자금을 받은지 5년이 지난 현재, 국민연금의 투자금을 돌려주는 것을 포기한 SK그룹은 아직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내년엔 또 다시 콜옵션 행사 기한이 도래한다.
만약 SK그룹 내부에서 그 누구라도 투자자의 자금을 반드시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더라면, 적어도 투자자들의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더라면 "SK그룹이 다시는 외부 투자자와 협업이 어려울 것이다"란 냉정한 평가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심지어 국민연금의 자금을 돌려주려는 노력도 없는 마당에 그 어떤 투자자가 무섭겠냐"는 평가가 나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이런 가운데 최근 투자를 총괄한 수장마저 바꼈으니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을 구조가 마련돼 버렸다.
SK그룹은 아직 투자자들의 무서움을 제대로 맛보지 못했다. 삼성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아직도 홍역을 치르고 있다. 또 어설프게 삼성중공업-삼성엔지니어링(現 삼성E&A)의 합병을 언급했다 뭇매를 맞았다. 현대차그룹 역시 야심차게 지배구조 개편을 발표했다가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철회했고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대책 마련에 고심중이다. 이런 실패로 인한 기회비용은 돈으로 환산하기 어렵다.
SK그룹 계열사 조정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엄밀히 말하면 아직 시작도 하지 못했는데 이미 너무 많은 시나리오가 발표되고 급진적인 인사가 단행됐다. 매각·합병을 비롯한 앞으로 조 단위 쏟아질 거래들엔 무수히 많은 재무적투자자와 주주들이 이해관계자로 포함돼 있다. 아직 이들을 위한 대책은 언급조차 되지 않는다.
앞으로 진행될 SK발(發) 거래들의 본질에 '주주'와 '투자자'가 중심이 아니란 의미다. SK그룹은 SK온 그리고 SK온과 함께 '절대' 쓰러져선 안되는 무언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투자자들의 동의를 구해야할지 가늠하기도 어렵다. 투자자, 주주들의 반발과 소송전이 시작되면 돈을 들여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발생한다. SK그룹은 존폐를 걱정해야할 위태롭고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중이지만 경영진들이 그 심각성을 얼마나 공유하고 있는지는 미지수다.
SK그룹이 사세를 확장하던 시절 '파이낸셜스토리'란 단어가 탄생했다. 사실 파이낸셜 스토리의 상당수는 남의 돈으로 쓰여져 왔다. 이제 하나씩 하나씩 갚아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입력 2024.07.03 07:00
취재노트
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24년 06월 30일 07:00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