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협회 "비우량 시공사는 자금 조달 난항"
신세계운용 "리츠 수익률 개선해야…회수 어려워"
한국토지신탁 "신탁 통한 펀드·리츠·PFV 투자안 필요"
우미건설 "개발사업 투자없인 건설사 새 위기 우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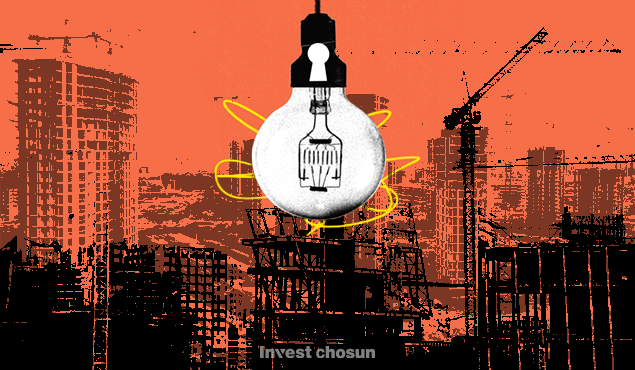 이미지 크게보기
이미지 크게보기- (그래피=윤수민 기자)
정부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도 개선방안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PF 시장참여자들은 PF 위기 재발을 막자는 정부의 뜻에는 공감하지만, 각 참여자의 이해를 조율하기 위해서는 오랜 논의가 필요해보인다.
지난 10일, 법무법인 율촌은 부동산 PF 제도 개선 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를 앞두고 제도 방향성과 이와 관련해 업계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14일 PF 안정성을 높이고 주택공급은 활성화하기 위해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과제는 크게 ▲안정적인 수준의 자기자본 확충 기반 마련 ▲부동산 PF 시장의 공정 질서 확립 ▲역량있는 한국형 디벨로퍼 육성이며, 올해부터 관련 법령 개정, 금융권 TF 운영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진다.
김승범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 과장은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은 앞으로 발생하는 PF 위기가 재발하지 않고, 국내 PF 사업을 선진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에 방점을 찍었다"고 말했다.
설명회에 참가한 주요 패널들은 반복되는 국내 PF 위기론에 마침표를 찍자는 데에 공감대를 모았다.
이현석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국내 PF 위기는 한국 부동산 개발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반복 발생했다"며 "(PF 사업에서 시공사, 신탁사, 금융사 등이) 보증을 통해 위험을 분산했기 때문에 (문제에) 버틸 수 있었다. 다만, 최근 정치적 사태 등을 고려하면 금융시장은 버틸만큼 버텼다고 보이며 건설과 개발시장은 상반기 상당히 우려스러운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걱정했다.
이 교수는 PF 시장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브릿지론에 대한 인수확약 등을 통한 브릿지론과 본PF 연계, PF 사업장에 출자자(LP)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부동산 개발 과정에서) LP에게 확보한 자기자본의 퀄리티에 따라 (개발주체의) 대출자금 성격과 이자율이 결정된다"며 "LP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동산 개발시장이 금융시장의 눈높이에 맞춰 투명해져야 한다. 가령 부동산개발 사업타당성 평가 결과나 사업자 자질 평가 결과 등이 공개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책 방향을 공감하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진 부동산개발협회 정책연구실장은 "(금감원의 발표에 따르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상 사업장은 대출이 잘된다지만, (실상은) 우량 시공사의 사업장만 정상적으로 PF가 이뤄져 시장에서 체감하는 정상 사업장에 대한 자금 조달은 여전히 어렵다"며 "(정책 방향을)단기와 중장기 계획으로 나눠서 접근해 영세 업체가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면 좋겠다"고 전했다.
장길선 신세계프라퍼티투자운용 이사는 "정부의 지원이 있지만 리츠는 투자금 회수(엑시트)가 어렵고 강한 임대료 규제로 사업자가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PF 위험성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그 리스크가 리츠로 전가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PF 지원방안으로 기업구조조정(CR)리츠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리츠 등을 활용하는 방안은 공감하나, 리츠 사업자의 수익률을 개선할 방안을 강구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심창우 한국토지신탁 전무는 "국내 PF 개발 대부분 신탁 방식으로 이뤄지는 만큼 (중략) 신탁 방식을 통해 펀드나 리츠, PFV가 가능해진다면 구조적인 유연성이 발휘될 수 있다"며 "또한 최근 할인 매수 기회가 많이 있지만 사업장을 인수해 재구조화할 주체가 부족하다. 역량과 경험이 있는 운영 주체에 블라인드 형태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시장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 말했다.
김정훈 우미건설 상무는 "개발 사업 투자를 활성화할 고민이 필요하다. (PF 자기자본비율 상향을 위해 대출 비중을 줄였는데) 개발 사업에 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면 개발 사업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결국 건설사의 수주 물량 감소로 이어지고, 건설사는 또 다른 이유의 위기를 겪을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 상무는 "후분양 위주인 선진국과 달리 한국은 선분양 시장이라 전체 개발 비용의 20~30%의 자금만 조달하면 나머지는 분양 대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며 "전체 사업비의 30%를 자기자본(에쿼티)로 조달하라지만(중략) (선·후분양의) 사업 형태에 따라 적정 에쿼티 비율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